인간을 욕되게 하는 저임금 노동을 고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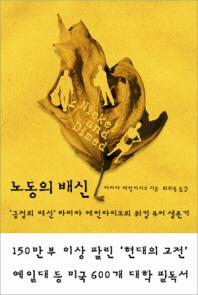
에런 라이크는 잡지 편집장과 점심식사 중에 빈곤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하다가 누군가 비숙련 노동자들이 한 시간에 6~7달러를 받고 생활이 가능한지 현장에 뛰어들어 체험취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때 편집장이 “당신이 해야죠” 하고 그녀를 부추긴다. 나이는 오십을 훌쩍 넘고 생물학 박사에 화이트칼라 여성 지식노동자가 하루아침에 허드렛일을 하는 저임금 육체노동자가 되어 잠입 취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녀가 알고 싶었던 것은 저임금 노동을 계속하면서 과연 생활이 가능한가라는 점이었다. 웨이트리스에서 청소부로, 그리고 요양원 보조원, 월마트 판매 직원으로 직업을 옮기면서 때로는 투잡까지 뛰며 돈을 아끼기 위해 분투하지만 생활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혼자서 실험에 뛰어든 작가의 처지로만 보면 간신히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겠지만 아이가 있다거나 한다면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었다.
부잣집을 돌며 집안을 청소해야 하는 일을 했을 때 한 동료는 일 때문에 허리를 다쳐 등에 메는 청소기도 사용하지 못했다. 그것이 또 임금을 깎이는 이유가 됐다. 청소를 하다 다리를 다친 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그 말마저도 못할 만큼 불안에 떨었다. 몸을 다치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이들은 저임금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몸을 누일 공간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싱글맘 콜린은 말한다. “내가 바라는 건 다만 가끔씩 꼭 쉬어야 할 때 하루 쉴 수 있었으면, 그리고 그래도 다음날 식료품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에런 라이크는 직장 내 권력관계에도 주목한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그 돈을 받아 쥐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 그들은 심리적으로도 관리자에게 묶여 있는 것이다. 관리자는 그들을 이간질 해 임금을 차별적으로 주고, 노동자는 관리자의 맘에 들기 위해 병도 숨기고 할 수 없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돌봄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들은 이곳에서도 버려질까 두려워한다.
《노동의 배신》은 출간 후 지금까지 150만 부 이상 팔려 나갔다고 한다. 10년 전에 쓰인 책이지만, 저자가 후기에도 달아놓았듯 호황기였던 그때의 미국을 감안한다면 경제위기를 겪는 지금의 삶은 몇 배로 힘들 것이다. 이 책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각성을 하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이들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우리 현실 역시 다르지 않다. 그래도 희망은 우리가 연대감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위장취업을 했던 한 선배의 말이 떠오른다. 공장에서 쫓겨나 우연히 복학했던 학교 앞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직원들을 우연히 만났을 때 빵을 사서 건네주었다고 한다.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헤어졌던 그 옛 동료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채의식이랄까, 자신이 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한다. 자신과 달리 그들에게는 돌아가야만 하는 직장이 그 공장이었고 생활이 달린 문제였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말이다. 에런 라이크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 인간을 욕되게 하는 저임금 노동을 고발하는 이 책 《노동의 배신》은 노동의 경험이 연대의 기반이 된다는 진리도 다시 깨닫게 해준다.
바버라 에런라이크 지음, 최희봉 옮김, 부키(2012)
